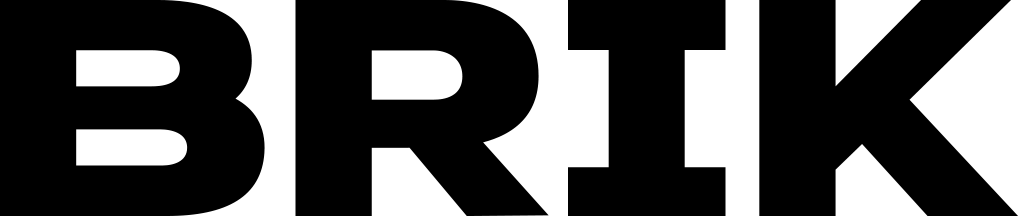어떤 사람이나 브랜드를 떠올릴 때, 이미지나 분위기보다 하나의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하면 ‘일등’이 현대하면 ‘뚝심’이 엘지하면 ‘인화’같은 그 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이죠. 물론 이들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의견을 담은 단어들이지만,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머리 속에 이들 기업에 맞는 단어가 빠르게 떠올려지는 건 그 게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기 보다는 기업들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전달했기 때문일겁니다. 저절로 형성된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들이 우리들의 인식 속에 전략적으로 ‘일등’, ‘뚝심’, ‘인화’라는 단어들을 심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삼성, 현대, 엘지처럼 역사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막대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소비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기업이나 브랜드 스스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이 ‘단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이나 기업을 어떤 단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스스로의 태도도 바뀝니다.
나를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미래의 사업가가 되기 위한 준비생’으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그저 회사 소속의 일원으로써의 수동적 역할을 넘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한명의 평범한 독자’라고 했을 때와 ‘미래 작가의 입장에서 보는 평론가’라고 정의는 것은 책을 보는 시선이나 관점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은 우아한형제 김봉진 의장의 페이스북을 읽고 감탄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세개의 단어를 설명하는 대목이었는데요. ‘경영하는 디자이너’, ‘과시적 독서가’, ‘푸드테크 창시자’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시더군요. 단어 하나 하나가 딱딱 들어 맞는 게 이 여섯개의 단어, 딱 세개의 개념으로 자신을 명확히 정의내릴 수 있다는 게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냥 ‘디자이너’라면 평범한데, ‘경영하는’이라는 수사가 붙으니 완전히 독보적인 느낌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독서가들은 많지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책을 읽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설령 많다고 해도 이렇게 대 놓고 자랑질하는 게 조심스러울텐데, 그리 밉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책 읽는 건 어떤 식으로든 해로운 행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푸드테크’라는 용어도 이미 일반적인 게 됐지만, ‘창시자’라는 단어가 따라오니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이걸보니 자신을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냐를 결정한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저희 회사 이름인 BRIK과 연계해서 나를 정의해 봤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기 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될거야, 되고싶어’라는 선언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통념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커’, ‘새기록을 경신해가는 브리커’, ‘기회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이렇게 세가지로요.
어떤가요? 저랑 이 단어가 어울리나요? 어울리는 지는 확신이 없지만,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크네요. 말하는대로 된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정의내린대로 사람이든 브랜드든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적어봤습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내가 선점해야할 단어는 뭘까? 우리 브랜드가 선점해야할 단어는 뭘까? 어떤 단어를 보면, 내가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를 보고, 우리 브랜드를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단어들 중 어떤 단어를 남길 것인가?이런 질문들에 계속 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한 브랜드가 쓰는 단어가 곧 그 사람이고,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단어를 찾는 일이 어쩌면 그 사람의 그 브랜드의 미래를 찾는 일일지 모릅니다.